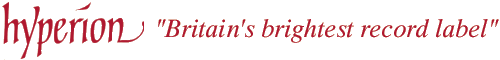
Welcome to Hyperion Records, a British classical label devoted to presenting high-quality recordings of music of all styles and from all periods from the twelfth century to the twenty-first.
Hyperion offers both CDs, and downloads in a number of formats. The site is also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Please use the dropdown buttons to set your preferred options, or use the checkbox to accept the defaults.

Polymath Sir Stephen Hough has a growing reputation as a composer of chamber, choral and above all solo piano music with four sonatas and a constellation of dazzling arrangements to his name. This album presents the premiere recording of his first piano concerto, recorded by the pianist with The Hallé under Sir Mark Elder. Its subtitle ‘The world of yesterday’ deliberately places the work in a broader context of the pianist-virtuosi of yesteryear who composed and performed their own piano concertos as they toured the world.
This album is also available on vinyl. » Click here for details.



But a twenty-first-century question arises: how does one write a piano concerto in the shadow of so much history and so much genius? There are two traps I think: the risk of regurgitating examples from the past—tired figuration dusted off and redressed for the new season; or else simply inserting the soloist as part of the orchestral texture—a team-player so anxious not to sound derivative that they end up sounding intimidated.
My Piano Concerto began with an email during one of the darker days of the pandemic: would I like to write a score for a movie about a concert pianist writing a piano concerto? As I looked at my blank concert diary, erased and masked, it seemed like a wonderful way to keep me busy. I’d never wanted to write a piano concerto (how to begin?) but the characters of this film gave me a handle: an ageing Austrian baroness and a young American composer in the 1930s. I wrote a waltz theme of Korngoldian decadence for the former, and took the bright white notes of interwar Americana for the other … and I started writing. The movie ended up going in a different direction but I had a thick pile of sketches on my desk, plenty of material for a concert work.
The concerto opens with the two motifs mentioned above—a naive melody played by violins and flutes, and a chain of rising thirds answering it with clarinet and harp. This latter fragment will later become the second movement’s waltz theme. The music slowly begins to blush with richer harmonies and increasing energy, until the solo piano enters to play an extended cadenza. After a while the ragged, splashing virtuosity dissipates and we hear the second motif as a slow, disarmingly sweet-toothed prequel ‘waltz before the waltz’—with a hat-tip to Bill Evans perhaps.
As this piano solo reaches its softest point, the strings sidle in, playing the sixteen-bar theme of the real waltz in its full, decadently seductive form. There follow seven variations where the pianist is mainly accompanist, providing a sparkle of decorative commentary. An eighth variation begins with a cranking-up of tempo until, back in C major, we hear both themes waltzing together, glistening with glockenspiel. A further acceleration tumbles us into the third-movement tarantella.
Now the waltz theme is squashed into staccato triad chords punctuated by xylophone flashes of the first theme. The energy works itself into a frenzy of agitation, propelling the music to a sudden silence, after which we hear the first theme flaring with fanfares and flourishes. The music increases in emotional intensity until the two themes are heard again, now stretched to a new height of sentimental ardour. A lurch of acceleration returns us hastily to the tarantella and from there, inexorably, to the frenetic, blazing conclusion of the piece, horns blaring and piano gnashing.
‘The world of yesterday’ … a subtitle with several meanings. It is borrowed from Stefan Zweig’s eponymous memoir with its celebration of Viennese culture before the First World War: the world as it used to be; nostalgia both literal and legendary. But this title became a tag for me writing this piece, representing the history of the piano concerto form itself and of the pianists who wrote these works. A world of yesterday indeed.
My little Sonatina nostalgica, lasting under five minutes, was written for my friend (and fellow Gordon Green student) Philip Fowke in celebrat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It is ‘nostalgic’ on three levels: firstly, it was commissioned by my old school, Chetham’s; secondly, it deliberately utilizes a romantic musical language of yesteryear; but most importantly it evokes literal homesickness for the places of our youth, in this case the little ‘sonatina’ village of Lymm in Cheshire.
The road from Danebank: Danebank was a grand country house which gave its name to today’s Dane Bank Road. Along and about this road are places resonant with memories for me, not least the nursing home where my mother lived her final years. By happy coincidence some of Philip Fowke’s forebears, the Watkin family, lived at … Danebank.
The bench by the Dam: Lymm Dam is the picturesque source of the village, a calm lake whose surface reflects mature trees and the handsome steeple of the parish church. I had a bench installed there commemorating my parents. Drive a few miles down the road and you’ll find the birthplace of John Ireland, whose musical shadow falls over this pastoral movement.
A gathering at the Cross: Lymm Cross is a monument at the heart of the village and this movement is an affectionate tribute to the countless friends and family members who have gathered for parties and dinners and carol-singing within striking distance of its crumbling sandstone structure over many years.
The first movement is in ABA form and is made up of two contrasting but equally lyrical motifs. A dotted-rhythm gesture appears in the final bar and becomes the theme of the second movement. The finale plays with these three ideas, tossing them around in a spirit of celebration.
Before my Partita I had written four piano sonatas of a serious, intense character, so when I was commissioned by the Walter W Naumburg Foundation to write a piece for its 2017 competition winner, Albert Cano Smit, I felt I wanted to write something different—something brighter, something more celebratory, more nostalgic. Indeed, a piece deliberately, unashamedly drawing on some early twentieth-century influences and tonal gestures.
The work is in five movements. The outer, more substantial bookends suggest the world of a grand cathedral organ. The first of these alternates between ceremonial pomp and sentimental circumstance, whereas the final movement, taking thematic material from the first, is a virtuosic toccata—a sortie out of the gothic gloom and into brilliant Sunday sunshine. At the centre of the work are three shorter movements, each utilizing the interval of a fifth: a restless, jagged capriccio of constantly shifting time signatures, and two Cancións y Danzas, inspired by the Catalan composer Federico Mompou.
Stephen Hough © 2025
하지만 21세기인 현재 상황에서 (이런 관습을 따르기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토록 긴 세월에 걸쳐 수많은 천재가 남긴 협주곡이 있는데 어떻게 피아노 협주곡을 써야 하나, 하는 문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부한 형식을 다시 꺼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살짝 수정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사례를 그냥 반복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그저 피아니스트를 오케스트라 구조의 일부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이때 독주자는 팀 플레이어로서 이질적인 음향을 내지 않으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결국에는 위축된 소리를 내게 된다.
내 피아노 협주곡은 팬데믹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받은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되었다. 그 이메일은 피아노 협주곡을 쓰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다룬 영화에 들어갈 작품을 써달라는 요청이었다. 여기저기 지워지고 가려진, 텅 빈 연주회 일정을 보고 있자니 바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사실 그때까지 한 번도 피아노 협주곡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등장인물, 나이 든 오스트리아 남작 부인과 젊은 미국 작곡가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남작 부인을 위해서는 코른골트 풍의 퇴폐적인 왈츠 주제를 썼고 미국 작곡가를 위해서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인 1920-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온음계의 ‘하얀 건반’ 음악을 가져왔으며, 그렇게 작곡을 시작했다. 결국 영화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내 책상 위에는 두터운 스케치 뭉치가 남았고, 콘서트 작품을 쓰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협주곡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주제,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연주하는 소박한 선율과 여기에 응답하며 클라리넷과 하프가 연주하는 일련의 3도 상승 음형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후자의 단편은 나중에 2악장의 왈츠 주제가 된다. 음악은 차츰 더 풍부한 화음과 강한 힘으로 열기를 더하고, 마침내 독주 피아노가 등장해서 대규모의 카덴차를 연주한다. 잠시 후에 래그타임식의 화려한 비르투오시티가 잦아들면 두 번째 주제가 들리는데, 느리고 마음을 녹일 정도로 달콤한 프리퀄 격의 ‘왈츠 이전의 왈츠’로 빌 에반스에게 살며시 보내는 경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피아노 독주가 가장 부드러운 음향을 내는 지점에 도달하면 현악기가 슬며시 등장해서 16마디의 주제를 연주하는데, 퇴폐적이고 유혹적인 형태의 진정한 왈츠다. 그런 다음 일곱 개의 변주가 이어지며, 피아니스트는 주로 반짝이는 설명을 제공하는 반주자 역할을 맡는다. 여덟 번째 변주는 빠른 템포로 시작하지만 C장조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두 개의 주제가 함께 왈츠를 연주하며 글로켄슈필이 빛을 발한다. 그러고 나면 템포가 더욱 빨라지면서 3악장 타란텔라로 넘어간다.
이제 왈츠 주제는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3화음으로 부서지고, 첫 주제를 살짝 닮은 실로폰이 끼어든다. 그 힘은 격렬한 흥분을 만들다 음악을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내몰고, 그런 뒤 다시 팡파르와 화려한 음형으로 불타오른다. 음악은 점점 감정의 밀도가 강렬해지다 두 주제가 다시 등장하면서 한층 더 감상적인 열정으로 확장된다. 템포가 요동치듯 빨라지면서 타란텔라가 다시 등장하고, 호른이 요란하게 울리고 피아노가 화려하게 맞물리는 음형을 연주하는 가운데 광란으로 불타오르는 마지막 부분으로 거침없이 내달린다.
‘어제의 세상’...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이 부제는 슈테판 츠바이크 Stefan Zweig의 동명 회고록에서 가져왔다. 이 책에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빈 문화를 향한 찬사가 담겼는데 이제는 사라진 세상을 향한, 현실과 전설을 아우르는 노스텔지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이 제목은 작품을 쓰는 내내 내게 일종의 태그 역할을 했고, 피아노 협주곡 형식의 역사와 작품을 쓴 피아니스트들을 대변하는 의미가 되었다. 그야말로 어제의 세상이라고 할 만하다.
5분이 채 못 되는 아담한 작품인 ‘소나티나 노스탈지카 Sonatina nostalgica’는 내 친구이자 나와 마찬가지로 고든 그린 Gordon Green 교수의 문하생이었던 필립 포크 Philip Fowke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쓴 곡이다. 작품은 세 가지 측면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우선 내 모교인 채텀 음악원의 위촉으로 썼고, 두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낭만적인 옛 음악 언어를 활용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문자 그대로 젊은 시절의 장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체셔의 림에 있는 작은 ‘소나티나’ 마을을 향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I 데인뱅크로부터 난 길 The road from Danebank 데인뱅크 Danebank는 웅장한 시골 저택으로, 지금의 데인뱅크 로드는 이 저택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이 길과 그 주변에는 어머니가 말년을 보낸 양로원을 비롯해서 추억이 깃든 장소가 많다. 기분 좋은 우연의 일치로, 필립 포크의 조상인 왓킨 가문도 데인뱅크에 살았다.
II 림 둑에 있는 벤치 The bench by the Dam 림 둑 Lymm Dam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의 수원水源으로, 무성한 아름드리나무와 교구 성당의 멋진 첨탑이 수면에 비치는 잔잔한 호수다. 그곳에는 부모님을 기념해서 내가 설치한 벤치도 있다. 또 거기서 길을 따라 차를 타고 몇 마일만 가면 존 아일랜드 John Ireland의 생가가 있는데, 2악장의 목가적인 음악에는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III 교차로에서의 만남 A gathering at the Cross 림 크로스 Lymm Cross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기념비다. 3악장은 이 무너져 가는 사암 구조물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파티나 만찬에 가려고, 또 캐롤을 부르려고 모였던 친구와 친지들에게 바치는 애정 어린 헌사다.
1악장은 ABA 형식이며, 서로 대조적이지만 모두 서정적인 두 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악장 마지막 마디에 등장하는 부점 리듬의 음형이 2악장 주제가 된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앞서 등장한 세 가지 주제가 어우러지며 축제의 느낌을 자아낸다.
파르티타 Partita를 쓰기 전에 나는 진지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담은 피아노 소나타 네 곡을 썼다. 그래서 월터 W 나움부르그 재단이 2017년 콩쿠르의 우승자인 알버트 카노 스미트 Albert Cano Smit를 위해서 작품을 써달라고 의뢰했을 때는 뭔가 다른 걸 쓰고 싶었다. 좀 더 밝고 축하의 의미를 담은, 향수 어린 작품을 말이다. 그 결과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20세기 초반 음악의 영향과 음악적 표현에 의지했다.
작품은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졌다. 북엔드처럼 작품을 둘러싼 큰 규모의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은 대성당의 오르간을 암시한다. 1악장은 축전 풍의 화려함과 감상적인 분위기를 오가며, 반면 1악장에서 주제를 가져온 마지막 악장은 명인기적인 토카타 형식으로 고딕풍의 어둠에서 찬란한 일요일의 햇살로 나서는 짧은 여행과도 같다. 작품의 중심에 있는 세 개의 짧은 악장은 저마다 5도 음정을 활용했다. 하나는 박자가 계속 바뀌는 불안하고 들쭉날쭉한 카프리치오이며, 나머지 둘은 카탈루냐 작곡가 페데리코 몸푸 Federico Mompou에게서 영감을 받은 두 개의 ‘노래와 춤 Canción y Danzas’이다.
Stephen Hough © 2025
しかし、21世紀の疑問が生じる — これほどの豊かな歴史とこれほどの天才の大きな影の中で、どうやってピアノ協奏曲を書けばよいのか? 2つの罠があると、私は考えている。ひとつは、過去の例を繰り返すという危険性である — 使い古された装飾の埃を払って新たな季節用に装いを変えるのである。そしてもうひとつは、オーケストラのテクスチュアの一部として単純に独奏を挿入することである — チーム・プレーヤーが、独創性に欠けるように聞こえてはいけないと気を揉むばかりに、結局畏縮して聞こえてしまうのである。
私のピアノ協奏曲は、パンデミックのあの暗い時期のある日に届いた1通のEメールから始まった。ピアノ協奏曲を書くコンサート・ピアニストを描いた映画のための音楽を書きたいと思わないか?というのである。消されたり覆い隠されたりした空っぽのコンサート・スケジュールを見ると、これは私を忙しくしておくためのすばらしい方法に見えた。私はそれまでピアノ協奏曲を書きたいと思ったことは一度もないが(そもそもどうやって始めればよいのだ?)、この映画の登場人物たちが手がかりを与えてくれた。1930年代の、年老いたオーストリア人ピアニストと、若いアメリカ人作曲家である。前者のために、私はコルンゴルト風の退廃的なワルツの主題を書き、後者用には2つの世界大戦間のアメリカーナ〔古いフォークやカントリーに根ざしたアメリカ音楽〕の、明るい2分音符や全音符を選び… 音楽を書き始めた。映画は結局あらぬ方向へと進むことになったが、私の机の上にはスケッチの束が厚く積み重なり、コンサート用の作品を作るのに十分な量の素材となったのだった。
この協奏曲は、先述した2つのモティーフで開始される — ヴァイオリンとフルートで奏される素朴な旋律と、クラリネットとハープでそれに応答する、上行3度の連鎖である。この後者の断片は、後に第2主題のワルツの主題になる。音楽は、より豊かになっていく和声と増大していくエネルギーによってゆっくりと紅潮し始め、ついにピアノ独奏が入ってきて長いカデンツァを奏する。しばらくすると、まとまりがなく跳ね回るようなヴィルトゥオーゾ性が消散して、緩やかで心を和ませるほど甘ったるい「ワルツの前のワルツ」 — おそらくはビル・エヴァンスに会釈しているのである — の形で2番目のモティーフが聞こえてくる。
このピアノ独奏が最高にソフトな地点に達すると、弦楽が入ってきて、16小節のほんもののワルツの主題をすべて、退廃的なほど誘惑的な形で奏する。7つの変奏が続くが、そこではピアノは主として伴奏にまわり、火花の散るような装飾的な楽句を奏する。第8変奏はテンポを上げながら開始され、ハ長調に戻ると、2つの主題が、グロッケンシュピールできらきらと輝きながら一緒にワルツを踊るのが聞こえる。さらに速度を増して、私たちは第3楽章のタランテッラへと転がり込む。
今やワルツの主題は押し潰されて、スタッカートで奏される三和音になり、これにシロフォン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第1主題の閃光が区切りを入れる。エネルギー自体は熱狂的な興奮へと至り、音楽を推進していくが、突然沈黙が訪れると、その後にファンファーレとフラリッシュ〔華麗な楽句〕でメラメラと燃え立つ第1主題が聞こえる。音楽が感情の激しさを増していき、2つの主題が再び聞こえると、それは今では熱い感情の新たな高みへと引き延ばされる。加速が突然揺らめいて急いでタランテッラへと引き戻されると、そこからはもう止め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熱狂的で燃えるような結尾へと進み、ホルンが咆哮し、ピアノが歯ぎしりをする。
「昨日の世界」… この副題はいくつかの意味を持っている。第一次世界大戦前のウィーンの文化 — 昔の世界、文字通りのノスタルジーと伝説のノスタルジー — を愛でた、シュテファン・ツヴァイクの同名の回想録から借用したものである。しかしこの題名は、この曲を書いている私にとっては、ひとつの「タグ」になった。ピアノ協奏曲の形式自体の歴史と、これらの作品を書いたピアニストたちの歴史を示したのである。まさに昨日の世界である。
5分の長さもない小さなソナティナ・ノスタルジカは、友人の(そしてゴードン・グリーンの弟子仲間だった)フィリップ・フォークの70歳の誕生日を祝って書いたものである。これは、3つのレヴェルで「ノスタルジック」である。まず、チータムにある私の出身校の委嘱で書いたこと、第2に、昔のロマンティックな音楽言語を意図的に利用していること、しかしいちばん重要なのは、私たちの若かった頃の場所 — この場合はチェシャーの小さな「ソナティナ」的な村リム — へのホームシックを文字通り喚起していることである。
I 「デインバンクから延びる道」:デインバンクは、今日のデイン・バンク・ロードの名称のもとになった、広大なカントリー・ハウスである。沿道やその周囲には、私の思い出と共鳴する場所がいくつかあるが、なにより私の母が最後の数年を過ごしたナーシング・ホーム〔高齢者施設〕はそうである。うれしい偶然の一致で、フィリップ・フォークの先祖であるワトキン家の人々も… デインバンクに住んでいたのだった。
II 「ダムのそばのベンチ」:リム・ダムは、村の中の絵画のように美しい場所で、その静かな水面が紅葉した木々や教会区教会の立派な尖塔を映し出す。私はそこに、両親の思い出にベンチをひとつ設置してもらった。道を数マイル進んでいくと、ジョン・アイアランドの生誕地があるが、その音楽の影が、この牧歌的な楽章にかかっているのである。
III 「十字架の下の集い」:リム・クロスは、この村の中心部にある記念碑で、この楽章は、無数の友人たちや家族への愛情を込めたトリビュートである。彼らは長年にわたって、ぼろぼろに崩れる砂岩の構造物に驚くほど近づいて集まり、パーティーを開き、ディナーを楽しみ、キャロルを歌ってきたのである。
第1楽章はA-B-Aの形式で、2つの対称的な、しかし同様に叙情的なモティーフで構成されている。最終小節で付点リズムの動きが現れ、これが第2楽章の主題になる。フィナーレは、これらの3つの楽想と戯れ、祝祭の精神でこれらをやり取りする。
パルティータを作曲する前に、私は真摯で激しい性格を持ったピアノ・ソナタを4曲書いていたので、ウォルター・W・ノームバーグ財団が2017年度のコンクール優勝者アルベルト・カノ・スミットのために1曲書いてほしいと依頼してきた時、私は何か異なったものを書きたいと感じた — もっと明るいもの、もっと祝祭的な、もっとノスタルジックなもの。まさに、20世紀初期の影響と調の動きを意図的に、臆面もなく活用した作品である。
この作品は、5つの楽章でできている。両端に置かれた、中身の充実した楽章が、大聖堂のオルガンを提起する。第1楽章は、儀式的な華やかさとものものしい感情の間を交替するが、その第1楽章の主題素材を取り入れた終楽章は、ヴィルトゥオーゾ的なトッカータである — ゴシックの暗闇から華麗な日曜日の陽光へと向かって出撃するのである。この作品の中央には、もっと短い楽章が3つ置かれているが、それぞれが5度音程を利用している。拍子が常に変わる、せわしない、ぎくしゃくとした「カプリッチョ」と、カタルーニャの作曲家フェデリコ・モンポウに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た、2つの「歌と踊り」である。
Stephen Hough © 2025

